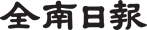작가 에세이·조자영>떳떳하지 않은 즐거움, 길티 플레져
조자영 수필가·한국문협·광주문협 회원
입력 : 2024. 04. 18(목) 10:46

조자영 수필가
“책 재밌소.?” 계산을 마치고 나가려던 손님이 돌아와 묻는다. 오지랖 넓은(?) 그의 호기심에 잠시 의아해하다 이내 정곡을 찔린 아이처럼 더듬거리며 답한다. “아, 네. 재밌네요 하하.” 사실, 재미는 없다. 습관적으로 볼 뿐. 더 정확하게는 잉여의 시간을 보내기 위한 행위다. 그마저 이리저리 흘러들어오는 잡음과 생각들로 인해 스캔하듯 눈으로만 훑을 뿐 머릿속에 남지 않고 곧바로 흘러 나가 버린다.
재미라, 재미있는 게 대체 뭘까. 그러고 보니 찾기가 어렵다. 요즘엔 일을 마치고 동네 한 바퀴 걷거나 한국과 일본의 실력자들이 한판 승부를 겨루는 ‘현역가왕’을 보고, ‘나는 솔로’라는 예능 프로를 보며 그들의 연애에 대리만족할 뿐이다. 일하고, 먹고, 자고, 하루는 대체로 재미없는 일들의 연속. 때때로 헛헛함도 밀려온다. 그래서일까. 사람들은 일탈을 소망하며 여행에 빠지고 자기만의 취미생활에 집중한다.
길티 플레져(guilty pleasure)라는 말이 있다. ‘죄책감을 느끼거나 해서는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심리적 만족감을 느끼며 즐기게 되는 행동’이다. 죄가 되는 줄 알면서도 즐기는 쾌락, 떳떳하지 않은 기쁨과 즐거움. 내겐 술을 마시는 일이나 빈속에 커피를 들이붓는 일, 긴 시간 스마트폰을 붙들고 할 일을 미루며 과하게 게으름을 피우는 일 등이다. 밤새 잠 못 들어 괴롭고 내일 일에까지 지장을 줄 걸 뻔히 알면서도 취하고, 위가 상한다는 걸 알고도 공복에 모닝커피를 마신다. 미룰수록 마음은 조급해지고 결국 자괴감이 밀려오는 걸 숱하게 체험하면서도 제어의 게으름은 일상이 되었다.
지난 가을엔 친정집 앞마당에서 나른한 볕을 쬐다가 옆 밭의 밤나무에 자꾸 눈길이 갔다. 시골 인심이라지만 남의 밭 열매를 탐하는 건 엄연한 범죄, 하지만 동생과 함께 기어이 밤 서리에 나섰다. 굵고 실한 밤이 바구니에 담길수록 기쁨도 쌓여 갔다. 아니, 짜릿했다. 남의 것을 몰래 훔치며 미칠 듯이 날뛰는 그 심장 박동의 스릴을 무엇에 견줄 수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몰려오는, 어쩔 도리 없는 죄책감에 나보다 더 들떠 있는 동생을 채근해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가책도 잠시, ‘이 정도 서리는 죄가 되지 않아.’ 다독이며 난 공범에게 아량 넓은 언니 행세까지 하고 있었다.
관성대로 살아가는 삶에서 길티 플레져의 유혹을 거부하기란 퍽 어려운 일이다. 다이어트를 결심하고서 밤늦게 치킨을 시켜 포식하거나 당 조절을 해야 할 사람이 다디단 믹스커피를 두 개씩 타서 즐기는 것 정도는 약과일 테다. 게임과 도박에 빠지고 흡연에 중독되거나 바람에 휘말리는 등 자칫 잘못하면 걸려들 수 있는 덫이 사방천지에 도사리고 있다.
그 유혹의 끝이 안타까운 죽음으로 치닫는 일도 있었다. 털털하고 유쾌해 보이던 사람, 중저음의 편안한 목소리만큼이나 모나지 않아 보이던 그. 영화 ‘기생충’에 출연해 선 굵은 연기력으로 세계적으로도 이름을 알린 그는 남부러울 게 없어 보였다. 착한 사람이라고 모두 입을 모으는 배우 L, 그는 어쩌다 그토록 무서운 풍랑에 휩쓸려버린 걸까.
잔뜩 식탐을 부리며 제 앞으로 음식 접시를 끌어다 놓고 보는, 입 짧은 아이처럼 난 잘 읽지도 않을 책을 곁에 지녀야 마음이 놓이곤 한다. 책상 앞에 펴 보지도 않은 책들이 쌓여 있건만 또다시 새로운 책을 찾아 주문하고 있다. 다달이 서너 권씩 누군가의 갖은 품이 들어간 책을 공짜로 받아 미처 다 훑어보기도 전에 폐지 수거함에 넣으면서도 이젠 죄책감조차 느끼지 못한다. 오늘도 읽는다고, 어쨌거나 책과 함께라고, 허송세월하고 있지 않다고 위무하며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마음의 허공을 그대로 둘지언정 아무것으로나 채우지는 않습니다.’ 피천득 님의 수필 ‘구원의 여상’ 중 한 줄을 떠올리며 오늘도 핑계를 만든다. 마음의 허공을 아무것으로나 채우지 않기 위해 난 그 자리에 책을 두는 거라고….
재미라, 재미있는 게 대체 뭘까. 그러고 보니 찾기가 어렵다. 요즘엔 일을 마치고 동네 한 바퀴 걷거나 한국과 일본의 실력자들이 한판 승부를 겨루는 ‘현역가왕’을 보고, ‘나는 솔로’라는 예능 프로를 보며 그들의 연애에 대리만족할 뿐이다. 일하고, 먹고, 자고, 하루는 대체로 재미없는 일들의 연속. 때때로 헛헛함도 밀려온다. 그래서일까. 사람들은 일탈을 소망하며 여행에 빠지고 자기만의 취미생활에 집중한다.
길티 플레져(guilty pleasure)라는 말이 있다. ‘죄책감을 느끼거나 해서는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심리적 만족감을 느끼며 즐기게 되는 행동’이다. 죄가 되는 줄 알면서도 즐기는 쾌락, 떳떳하지 않은 기쁨과 즐거움. 내겐 술을 마시는 일이나 빈속에 커피를 들이붓는 일, 긴 시간 스마트폰을 붙들고 할 일을 미루며 과하게 게으름을 피우는 일 등이다. 밤새 잠 못 들어 괴롭고 내일 일에까지 지장을 줄 걸 뻔히 알면서도 취하고, 위가 상한다는 걸 알고도 공복에 모닝커피를 마신다. 미룰수록 마음은 조급해지고 결국 자괴감이 밀려오는 걸 숱하게 체험하면서도 제어의 게으름은 일상이 되었다.
지난 가을엔 친정집 앞마당에서 나른한 볕을 쬐다가 옆 밭의 밤나무에 자꾸 눈길이 갔다. 시골 인심이라지만 남의 밭 열매를 탐하는 건 엄연한 범죄, 하지만 동생과 함께 기어이 밤 서리에 나섰다. 굵고 실한 밤이 바구니에 담길수록 기쁨도 쌓여 갔다. 아니, 짜릿했다. 남의 것을 몰래 훔치며 미칠 듯이 날뛰는 그 심장 박동의 스릴을 무엇에 견줄 수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몰려오는, 어쩔 도리 없는 죄책감에 나보다 더 들떠 있는 동생을 채근해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가책도 잠시, ‘이 정도 서리는 죄가 되지 않아.’ 다독이며 난 공범에게 아량 넓은 언니 행세까지 하고 있었다.
관성대로 살아가는 삶에서 길티 플레져의 유혹을 거부하기란 퍽 어려운 일이다. 다이어트를 결심하고서 밤늦게 치킨을 시켜 포식하거나 당 조절을 해야 할 사람이 다디단 믹스커피를 두 개씩 타서 즐기는 것 정도는 약과일 테다. 게임과 도박에 빠지고 흡연에 중독되거나 바람에 휘말리는 등 자칫 잘못하면 걸려들 수 있는 덫이 사방천지에 도사리고 있다.
그 유혹의 끝이 안타까운 죽음으로 치닫는 일도 있었다. 털털하고 유쾌해 보이던 사람, 중저음의 편안한 목소리만큼이나 모나지 않아 보이던 그. 영화 ‘기생충’에 출연해 선 굵은 연기력으로 세계적으로도 이름을 알린 그는 남부러울 게 없어 보였다. 착한 사람이라고 모두 입을 모으는 배우 L, 그는 어쩌다 그토록 무서운 풍랑에 휩쓸려버린 걸까.
잔뜩 식탐을 부리며 제 앞으로 음식 접시를 끌어다 놓고 보는, 입 짧은 아이처럼 난 잘 읽지도 않을 책을 곁에 지녀야 마음이 놓이곤 한다. 책상 앞에 펴 보지도 않은 책들이 쌓여 있건만 또다시 새로운 책을 찾아 주문하고 있다. 다달이 서너 권씩 누군가의 갖은 품이 들어간 책을 공짜로 받아 미처 다 훑어보기도 전에 폐지 수거함에 넣으면서도 이젠 죄책감조차 느끼지 못한다. 오늘도 읽는다고, 어쨌거나 책과 함께라고, 허송세월하고 있지 않다고 위무하며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마음의 허공을 그대로 둘지언정 아무것으로나 채우지는 않습니다.’ 피천득 님의 수필 ‘구원의 여상’ 중 한 줄을 떠올리며 오늘도 핑계를 만든다. 마음의 허공을 아무것으로나 채우지 않기 위해 난 그 자리에 책을 두는 거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