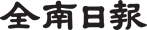서석대>동짓날의 희망
이용환 논설실장
입력 : 2024. 12. 19(목) 17:26

이용환 논설실장
“오늘은 동지 날/신생의 태양이 다시 밝아오는 날/숨 죽이고 억눌리고 죽어 있던/모든 것들이 새롭게 살아나는 날.” 얼굴 없는 시인으로 불렸던 박노해에게 겨울, 그 중에서도 동지((冬至))는 희망의 상징이었다. 1980년대 시집 ‘노동의 새벽’으로 한국 사회와 문단에 큰 충격을 안겼던 박 시인. 1991년 체포돼 1998년 특별사면으로 석방될 때까지 7년 6개월간 수감생활을 했던 그는 동지가 지나고 나면 밤은 점점 짧아지고, 낮은 길어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나긴 수감생활을 버텨냈다. 자신이 겪는 지금의 어둠도 동지가 지나면 서서히 바뀔 것이라는 희망도 잃지 않았다.
1978년 조세희 작가가 출간한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도 가장 긴 밤을 통해 희망을 꿈꾼다는 의미에서 동지의 주제와 맞닿아 있다. 반으로 갈린 한반도 남쪽에 살아가는 ‘난장이’. 도시 빈민과 노동자를 대변하는 그에게 겨울은 지옥이었고 , 주어진 하루 하루도 견디기 힘든 전쟁이었다. 그런 ‘난장이’가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희망은 ‘아무리 밤이 어두워도 동지가 지나면 해가 길어지듯 세상은 조금씩 조금씩 바뀔 것’이라는 믿음이었다. ‘눈물도 보람 없이 흘려야 하고, 마음은 억눌려도 결코 난장이의 희망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는 게 조 작가의 이야기다.
동지는 1년 중 밤의 길이가 가장 길고 낮의 길이는 가장 짧은 날이다. 한겨울 음의 기운에 휩싸인 만물에 양의 기운이 움트기 시작하는 것도 이때부터다. 겨울의 끝인 만큼 서서히 다가오는 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이기도 하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이날을 태양이 죽음에서 부활하는 날로 생각해 축제를 벌였다. 우리나라에서도 동지는 ‘작은 설’로 불렸다. 태양이 그런 것처럼 사람 역시 동지가 지나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해야 한다는 조상들의 각오였다. 액땜을 하기 위해 붉은 팥으로 팥죽을 쑤어 이웃과 나눠 먹었는 것도 이 때였다.
21일은 동지다. 이날을 시작으로 밤은 점점 짧아지고 낮은 그만큼 길어질 것이다. 올해는 전국 대학교수들이 사자성어로 ‘도량발호(跳梁跋扈·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부로 날뛴다)를 꼽았을 정도로 수많은 사건들이 뒤엉킨 격동의 한해였다. 너무 큰 충격과 분노에 잠을 설쳤던 기억도 유난히 많았다. 그래도 내일이 지나면 희망의 해가 다시 시작될 터다. 동지가 주는 가르침은 한 겨울의 어둠이 아니고 아무리 추운 겨울도 곧 끝나간다는 희망에 있다. 편가르기와 불통, 계엄과 탄핵까지 숨 가빴던 2024년의 끝 자락. 다가올 봄을 준비하며 동짓날부터 시작될 희망을 되새길 때다. 이용환 논설실장
1978년 조세희 작가가 출간한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도 가장 긴 밤을 통해 희망을 꿈꾼다는 의미에서 동지의 주제와 맞닿아 있다. 반으로 갈린 한반도 남쪽에 살아가는 ‘난장이’. 도시 빈민과 노동자를 대변하는 그에게 겨울은 지옥이었고 , 주어진 하루 하루도 견디기 힘든 전쟁이었다. 그런 ‘난장이’가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희망은 ‘아무리 밤이 어두워도 동지가 지나면 해가 길어지듯 세상은 조금씩 조금씩 바뀔 것’이라는 믿음이었다. ‘눈물도 보람 없이 흘려야 하고, 마음은 억눌려도 결코 난장이의 희망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는 게 조 작가의 이야기다.
동지는 1년 중 밤의 길이가 가장 길고 낮의 길이는 가장 짧은 날이다. 한겨울 음의 기운에 휩싸인 만물에 양의 기운이 움트기 시작하는 것도 이때부터다. 겨울의 끝인 만큼 서서히 다가오는 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이기도 하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이날을 태양이 죽음에서 부활하는 날로 생각해 축제를 벌였다. 우리나라에서도 동지는 ‘작은 설’로 불렸다. 태양이 그런 것처럼 사람 역시 동지가 지나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해야 한다는 조상들의 각오였다. 액땜을 하기 위해 붉은 팥으로 팥죽을 쑤어 이웃과 나눠 먹었는 것도 이 때였다.
21일은 동지다. 이날을 시작으로 밤은 점점 짧아지고 낮은 그만큼 길어질 것이다. 올해는 전국 대학교수들이 사자성어로 ‘도량발호(跳梁跋扈·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부로 날뛴다)를 꼽았을 정도로 수많은 사건들이 뒤엉킨 격동의 한해였다. 너무 큰 충격과 분노에 잠을 설쳤던 기억도 유난히 많았다. 그래도 내일이 지나면 희망의 해가 다시 시작될 터다. 동지가 주는 가르침은 한 겨울의 어둠이 아니고 아무리 추운 겨울도 곧 끝나간다는 희망에 있다. 편가르기와 불통, 계엄과 탄핵까지 숨 가빴던 2024년의 끝 자락. 다가올 봄을 준비하며 동짓날부터 시작될 희망을 되새길 때다. 이용환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