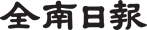김정숙 교수의 필름 에세이>진솔함으로 이민 1세대 할머니 울린 영화
정이삭 감독 ‘미나리’
입력 : 2024. 08. 27(화) 09:26

정이삭 감독 ‘미나리’.판씨네마㈜ 제공
 |
| 정이삭 감독 ‘미나리’.판씨네마㈜ 제공 |
이 의아함은 하나의 복선이었다. 2001년 필자 역시 교환교수 및 post-doc을 위해 미국행을 했다. 그곳에서 예배시간에 펑펑 운 적이 있었다. 당시 LA에는 2000여 개의 한인교회가 있었다. 이 중 한 교회를 다니면서 이민자들의 현실을 하나씩 알아가기 시작했다. 맨 먼저, 담임목사님이 second job으로 택시운전을 해야만 한다는 사실이 충격이었다. 교인 중 한국에서 떵떵거리며 살던 사장 내외분은 미국에서 청소를 직업으로 삼고 있어 손이 말이 아니었다. 남편 직업이 멀쩡해도 아내는 봉제공장에서 재단을 하는 등 바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바쁘지 않은 노인들은 실버 타운이나 백화점 로비에 앉아 바쁜 자식들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채 시간을 죽이며 살고 있었다. 이민자들의 너나없이 고단한 삶…. 이 모든 현실감이 눈물이 되어 쏟아졌던 것이다. 그래서 영화 ‘미나리’의 스토리는 폐부에 속속 스며들었다.
그래도 한인 이민자들은 자녀교육 열의가 남달라서 자녀들 중에 하버드를 위시한 아이비 리그 대학 출신자들을 배출하는 일이 꽤 많은 편이다. 이방인으로서 갖게 되는 팽창된 압박감이 폭죽 터지듯 터지며 보람으로 자리하는 순간일 게다. 그들의 강인한 디아스포라의 정착 에너지는 어디에서 왔을까. 디아스포라의 에너지를 넘어선 생활력, 인내력, 교육열, 적응력 등등 뿌리 깊은 한국인의 DNA가 기반이 되어주었지 않았을까. 이런저런 생각들은 영화 ‘미나리’가 계기였다.
병아리 감별사로 미국 이민생활 10년을 보낸 제이콥(배우 스티브 연)은 가족을 데리고 아칸소 주 한 농장터로 이사하며 새로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꾼다. 그곳에는 트레일러 하우스만 달랑 있을 뿐이다. 아내 모니카(배우 한예리)는 “우리가 약속했던 건이런 게 아니잖아”라며 몹시 불편한 심정을 드러낸다. 어린 아들 데이비드(배우 앨런김)는 “집에 바퀴가 달렸어” 하며 신기해 한다. 토네이도 경보가 일던 날, 비바람에 집이 날아갈까 불안에 떨어야 하는 가족들. 앤(배우 노엘 케이트 조)은 부모의 다툼이 천둥소리보다 더 무섭지만 동생을 다독이는 속 깊은 딸이 되어가고 있다. 제이콥은 아내를 달래기 위해 한국의 장모님을 모셔오기로 합의한다. 그렇게 척박한 미국에서 뿌리 내릴 땅을 찾던 고단한 이 가족에게 할머니 순자(배우 윤여정)가 찾아온다.
한국에서 고춧가루며 심장병을 앓고 있는 손자를 위한 한약재까지 바리바리 싸온 어머니를 보는 일은 척박한 이민생활에 얼마나 큰 위안인지 모니카의 눈이 말해준다. 데이비드는 입안에서 밤을 꺼내주고 한약을 먹이는 할머니가 낯설고 싫지만, 병으로 인해 죽음을 생각하는 자신의 두려움을 할머니는 냅다 떨궈준다. 할머니는 한국에서 가져온 화투놀이를 가르쳐 주고 미나리 씨앗을 숲 속 개울가에 파종하여 아이들에게 미나리를 수확하는 즐거움을 일깨워준다. “미나리는 어디서든 터 좋은 곳에 심으면 알아서 뿌리를 내리고 잘 살지. 김치에도 넣고 어떤 요리에도 어울리고 향도 좋아. 몸에도 좋으니 ‘원더풀’이야….”
데이비드와 할머니는 함께 노래를 만들어 부른다. “미나리 원더풀~! 미나리 원더풀~!” 제이콥의 농장 일은 순조롭지가 않다. 설상가상으로, 아이들을 돌보던 순자에게 뇌졸중이 발생한다. 데이비드의 병원 체크업 날, 뜻밖에도 아이의 건강이 호전돼가고 있다. 게다가 새로운 거래처도 뚫는다. 뭔가 희망이 보이는 순간이다. 그날 순자는 거동이 불편한 몸으로 쓰레기를 태우다 그만 저장창고를 태우고 만다. 죄책감과 허탈함으로 순자는 발걸음을 돌리고 그 길을 아이들이 막아선다. “할머니, 가지 마세요.” 이 영화는 미국 이민자 가정이 겪어봤음직한 어려움을 섬세하게 보여준다. 아칸소주 농장에서 자란 감독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했기에 더욱 리얼하게 절박한 현실을 그려낼 수 있었을 것이다. LA 한 한인교회에서 영화 ‘미나리’의 사전상영을 했을 적에,이민 1세대인 할머니들이 울음바다를 터트려 끝까지 볼 수 없었을 정도였다는 에피소드가 전해진다. 이 영화가 갖는 진솔함의 힘이다.
코리언 아메리칸은 적응과 배척 사이에서 미국인인지 한국인인지 때로 이방인으로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기도 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얻기도 하는 존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땅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서로가 얽혀 잘 자라는 한국의 미나리처럼 뿌리 깊은 한국인의 정서로써 함께 서로를 부둥켜안을 줄 아는 존재들이다. (백제예술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