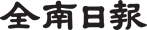"아득한 고향땅, 멀리서라도 보고싶어 금강산 3번 찾아"
● 6·25기획 실향민에게 듣는다 <중>
함경남도 북청군 출신 박영숙(89)씨
1·4 후퇴 당시 16살, 아버지와 함께 남하
금지옥엽 키워준 어머니와 70년 생이별
"첫 딸 낳을 때 친정엄마 생각에 눈물"
함경남도 북청군 출신 박영숙(89)씨
1·4 후퇴 당시 16살, 아버지와 함께 남하
금지옥엽 키워준 어머니와 70년 생이별
"첫 딸 낳을 때 친정엄마 생각에 눈물"
입력 : 2024. 06. 25(화) 18:33

함경남도 북청군 출신 박영숙(89)씨가 25일 광주 봉선동 자택에서 1950년 1.4 후퇴 당시 남하하던 과거를 설명하고 있다.
“높디높은 금강산에 오르면 멀리서나마 고향땅이 보일까 싶어 3번이나 금강산을 찾았지. 떠나온 이후로 70년 동안 한 번도 못 밟아본 고향땅이지만 아직도 눈만 감으면 생생하게 다 생각난다니까.”
수도 서울이 재함락 당했던 지난 1951년 1월, 16살 소녀는 평생을 금지옥엽 키워준 어머니와 생이별해야 했다.
1936년 함경남도 북청군에서 태어난 박영숙(89)씨는 1·4후퇴가 발생하기 며칠 전 계속되는 중공군의 공세에 상황이 위험해지자 남한행을 택했다. 당시 박씨는 거동이 힘든 친할머니와 그를 보필할 어머니를 고향에 남겨두고 아버지와 함께 남쪽으로 가는 배에 몸을 실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길어봤자 20일 정도일 줄 알았던 이별이 70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박씨는 “당시 중공군이 젊은 사람과 남자들을 잡아간다는 소문에 어머니가 아버지, 사촌오빠와 함께 먼저 남쪽으로 가 있으면 20일 후에 따라 내려가겠다고 말했다”며 “어쩔 수 없이 엄마와 할머니를 뒤로하고 100여명 남짓 탄 목선에 몸을 실어 피난길에 올랐다”고 회상했다.
이어 “배를 정박해 내리려 하면 거절당하기 일쑤라 조금씩 내려오다 보니 속초를 거치고 주문진, 부산에 이어 거제도까지 내려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약속했던 20일이 지나도 어머니의 모습은 그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었고 어느덧 7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박씨는 “무남독녀로 자라면서 한 끼라도 거를까 걱정하던 어머니 품을 떠나 살게 된 전쟁터에서는 유엔군이 버린 깡통을 주워와 거기에 보리쌀과 바닷물로 밥을 지어먹었다”며 “한겨울 차디찬 바닷물로 세수도 했다. 피부는 매일같이 쩍쩍 갈라졌고, 그럴 때마다 어머니 생각에 눈물을 흘렸다”고 말했다.
매일이 두려움으로 가득한 전쟁 중이었지만 함께 남한으로 내려온 아버지 덕에 고등학교까지 마칠 수 있었다. 직장 생활을 시작하자 아버지는 맞선 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고,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이북 남자’였다.
박 씨는 “언제 바로 통일을 할지 모르는데 남한 지역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면 또 부모님과 생이별을 해야 하니 이북 남자와 결혼해야 한다 하셨다. 아버지의 설득에 함경도 출신의 남자를 만났고, 그를 따라 광주로 오게됐다”고 말했다.
그리고 결혼 1년 만에 첫 딸을 품에 안았다. 박씨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출산할 때 가장 어머니가 그립고 빈자리가 컸다”면서 “엄마가 된 순간 ‘우리 엄마도 나를 이렇게 낳았겠지’라는 생각에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었다”며 “양장을 배운 어머니는 원단을 떼다 무남독녀 외동딸이었던 내 몸에 꼭 맞는 원피스를 만들어 주곤 하셨다. 내가 좋아하는 모습에 활짝 웃으시던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고 추억했다.
이어 “수소문 끝에 20여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며칠을 울었는지 모른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박씨의 고향은 함경남도 북청군 양화면이다. 반농반어를 하는 조용한 어촌인 이곳에는 작은 해수욕장과 부두가 있었다.
박씨는 “고향을 떠나온 지 벌써 70년이 지났다. 먼발치에서라도 고향이 보고 싶어 금강산 관광을 세 번이나 다녀왔다”며 “멀리서 본 고향의 풍경은 많이 변했고, 지금 간다 하더라도 아는 사람 하나 없을 테지만 그래도 그곳 땅 한번 밟아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도 죽기 전에 고향 땅을 한 번만 밟아보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다. ‘하루빨리 평화통일이 돼서 눈 감기 전에 고향 땅 한번 밟아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아직도 하곤 한다”고 소회했다.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
수도 서울이 재함락 당했던 지난 1951년 1월, 16살 소녀는 평생을 금지옥엽 키워준 어머니와 생이별해야 했다.
1936년 함경남도 북청군에서 태어난 박영숙(89)씨는 1·4후퇴가 발생하기 며칠 전 계속되는 중공군의 공세에 상황이 위험해지자 남한행을 택했다. 당시 박씨는 거동이 힘든 친할머니와 그를 보필할 어머니를 고향에 남겨두고 아버지와 함께 남쪽으로 가는 배에 몸을 실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길어봤자 20일 정도일 줄 알았던 이별이 70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박씨는 “당시 중공군이 젊은 사람과 남자들을 잡아간다는 소문에 어머니가 아버지, 사촌오빠와 함께 먼저 남쪽으로 가 있으면 20일 후에 따라 내려가겠다고 말했다”며 “어쩔 수 없이 엄마와 할머니를 뒤로하고 100여명 남짓 탄 목선에 몸을 실어 피난길에 올랐다”고 회상했다.
이어 “배를 정박해 내리려 하면 거절당하기 일쑤라 조금씩 내려오다 보니 속초를 거치고 주문진, 부산에 이어 거제도까지 내려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약속했던 20일이 지나도 어머니의 모습은 그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었고 어느덧 7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박씨는 “무남독녀로 자라면서 한 끼라도 거를까 걱정하던 어머니 품을 떠나 살게 된 전쟁터에서는 유엔군이 버린 깡통을 주워와 거기에 보리쌀과 바닷물로 밥을 지어먹었다”며 “한겨울 차디찬 바닷물로 세수도 했다. 피부는 매일같이 쩍쩍 갈라졌고, 그럴 때마다 어머니 생각에 눈물을 흘렸다”고 말했다.
 |
| 박영숙(오른쪽)씨와 남편 최민철씨의 결혼식 사진. 최민철씨의 고향은 함경남도 함흥시다. |
박 씨는 “언제 바로 통일을 할지 모르는데 남한 지역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면 또 부모님과 생이별을 해야 하니 이북 남자와 결혼해야 한다 하셨다. 아버지의 설득에 함경도 출신의 남자를 만났고, 그를 따라 광주로 오게됐다”고 말했다.
그리고 결혼 1년 만에 첫 딸을 품에 안았다. 박씨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출산할 때 가장 어머니가 그립고 빈자리가 컸다”면서 “엄마가 된 순간 ‘우리 엄마도 나를 이렇게 낳았겠지’라는 생각에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었다”며 “양장을 배운 어머니는 원단을 떼다 무남독녀 외동딸이었던 내 몸에 꼭 맞는 원피스를 만들어 주곤 하셨다. 내가 좋아하는 모습에 활짝 웃으시던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고 추억했다.
이어 “수소문 끝에 20여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며칠을 울었는지 모른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
| 이북5도민회 각 도 부녀회장과 함께했던 소풍. |
박씨는 “고향을 떠나온 지 벌써 70년이 지났다. 먼발치에서라도 고향이 보고 싶어 금강산 관광을 세 번이나 다녀왔다”며 “멀리서 본 고향의 풍경은 많이 변했고, 지금 간다 하더라도 아는 사람 하나 없을 테지만 그래도 그곳 땅 한번 밟아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도 죽기 전에 고향 땅을 한 번만 밟아보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다. ‘하루빨리 평화통일이 돼서 눈 감기 전에 고향 땅 한번 밟아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아직도 하곤 한다”고 소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