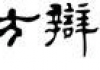[전남일보]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경찰 “인력 등 철저 대비”
국정원법 3년 유예 후 시행
전문가 “인력 전문성 필요”
광주경찰 “인력 20% 충원…
교육 등 통해 수사역량 강화”
전문가 “인력 전문성 필요”
광주경찰 “인력 20% 충원…
교육 등 통해 수사역량 강화”
입력 : 2024. 01. 16(화) 17:46

광주경찰청.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인 ‘대공수사권’이 지난 1일부터 국가정보원에서 경찰로 완전히 이관됐다.
전문 인력 부족으로 한계를 보일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경찰은 안보수사관 인력 증원 등 철저한 대비를 마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국정원법이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국정원 대공 수사권이 폐지되고 이를 경찰이 전담한다. 기존에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와 구속영장 신청이 가능했던 국정원은 이제 해외 정보망 등을 통해 수사 첩보를 입수한 뒤 이를 경찰에 전달하는 역할만 하게 된다. 국내 정보 수집 활동 역시 금지된다.
대공수사권은 간첩이나 좌익사범 등을 찾아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 수사하는 권한을 말한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원이 가지고 있던 대공수사권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3년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1일부터 시행되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공식적으로 폐지되고 이를 경찰이 전담하게 됐다. 중앙정보부 설립 이후 63년 만이다.
전문가들은 수사공백을 우려한다. 최근 북한이 북방한계선(NLL) 인근 포병 사격과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대공수사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 법 개정 후 대선 국면이 이어진 데다 정권 교체로 국정원 역할에 대한 정부의 기조가 바뀌면서 수사 업무 이관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기도 했다.
전문 인력부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힌다. 경찰에 해외 방첩망이 없고 옮겨 다니는 인사 이동 시스템상 수사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가 어렵다는 우려에서다. 국내 첩보는 경찰이 맡지만 해외 첩보 수집은 국정원이 담당하게 될 경우 국정원이 입수한 첩보가 경찰로 넘어와 수사로 이어지기까지 낭비되는 시간이 많다는 지적이다.
김정규 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안보조사는 보통 기획기간을 5년 정도 장기간을 두고 하는 일이 많다. 이전부터 진행됐던 노하우나 첩보를 갖고 수사하는 경우가 많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인원을 늘리는게 만사는 아니다. 전문성이 필요하고 기존의 노하우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대공수사를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산하에 안보수사국을 설치하고 안보수사 연구·교육센터도 만들었다. 안보수사국 산하에는 핵심 수사를 전담하는 정예팀인 ‘안보수사단’이 신설된다. 각 시도 경찰청에는 안보수사대 수사관을 증원해 광역 단위 수사체계 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전체 안보수사 인력도 지난해 724명에서 올해 1127명으로 56% 증원했다. 이 중 순수 대공수사 인력은 700여명으로 종전의 400명보다 75% 늘었다. 대부분 내부 재배치지만 안보 전문가인 신규 인력도 20명 채용했다. 지난해부터는 ‘안보수사관 자격관리제’를 시행해 수사관들의 역량을 관리하고 있다.
광주경찰도 수사인력을 증원할 계획이다. 업무 특성상 정확한 정원을 밝히지 않았지만, 광주경찰 안보수사 인력은 전체 30여명이다. 이중 20~30%가 올해 증원된다. 수사역량도 전국에서 가장 높다. 광주경찰은 지난해 안보사범 검거에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교육 등을 통해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본청 차원에서도 보완하는 중”이라며 “업무 특수성이 있어서 타부서에 비해 인사이동도 적다. 국정원, 국군방첩사령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송민섭 기자
전문 인력 부족으로 한계를 보일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경찰은 안보수사관 인력 증원 등 철저한 대비를 마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국정원법이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국정원 대공 수사권이 폐지되고 이를 경찰이 전담한다. 기존에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와 구속영장 신청이 가능했던 국정원은 이제 해외 정보망 등을 통해 수사 첩보를 입수한 뒤 이를 경찰에 전달하는 역할만 하게 된다. 국내 정보 수집 활동 역시 금지된다.
대공수사권은 간첩이나 좌익사범 등을 찾아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 수사하는 권한을 말한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원이 가지고 있던 대공수사권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3년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1일부터 시행되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공식적으로 폐지되고 이를 경찰이 전담하게 됐다. 중앙정보부 설립 이후 63년 만이다.
전문가들은 수사공백을 우려한다. 최근 북한이 북방한계선(NLL) 인근 포병 사격과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대공수사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 법 개정 후 대선 국면이 이어진 데다 정권 교체로 국정원 역할에 대한 정부의 기조가 바뀌면서 수사 업무 이관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기도 했다.
전문 인력부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힌다. 경찰에 해외 방첩망이 없고 옮겨 다니는 인사 이동 시스템상 수사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가 어렵다는 우려에서다. 국내 첩보는 경찰이 맡지만 해외 첩보 수집은 국정원이 담당하게 될 경우 국정원이 입수한 첩보가 경찰로 넘어와 수사로 이어지기까지 낭비되는 시간이 많다는 지적이다.
김정규 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안보조사는 보통 기획기간을 5년 정도 장기간을 두고 하는 일이 많다. 이전부터 진행됐던 노하우나 첩보를 갖고 수사하는 경우가 많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인원을 늘리는게 만사는 아니다. 전문성이 필요하고 기존의 노하우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대공수사를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산하에 안보수사국을 설치하고 안보수사 연구·교육센터도 만들었다. 안보수사국 산하에는 핵심 수사를 전담하는 정예팀인 ‘안보수사단’이 신설된다. 각 시도 경찰청에는 안보수사대 수사관을 증원해 광역 단위 수사체계 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전체 안보수사 인력도 지난해 724명에서 올해 1127명으로 56% 증원했다. 이 중 순수 대공수사 인력은 700여명으로 종전의 400명보다 75% 늘었다. 대부분 내부 재배치지만 안보 전문가인 신규 인력도 20명 채용했다. 지난해부터는 ‘안보수사관 자격관리제’를 시행해 수사관들의 역량을 관리하고 있다.
광주경찰도 수사인력을 증원할 계획이다. 업무 특성상 정확한 정원을 밝히지 않았지만, 광주경찰 안보수사 인력은 전체 30여명이다. 이중 20~30%가 올해 증원된다. 수사역량도 전국에서 가장 높다. 광주경찰은 지난해 안보사범 검거에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교육 등을 통해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본청 차원에서도 보완하는 중”이라며 “업무 특수성이 있어서 타부서에 비해 인사이동도 적다. 국정원, 국군방첩사령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