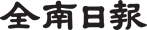서석대>태봉마을을 아시나요
취재1부 노병하 정치부장
입력 : 2024. 05. 29(수) 18:04

광주 동구 끝자락인 소태동에 자리를 잡은 ‘왕실의 태가 묻힌 곳’이라는 태봉(胎封)마을은 조용하지만 아름다운 곳이었다. 약 100가구 규모의 주민들이 무등산 자락을 등에 업고 자연과 어울려 살아가고 있었다. 허나 조용하면서 평화로웠던 이 마을은 그러나 어느해 어느 봄을 기점으로 조용함 부터 더욱 무겁고 깊은 침묵 속으로 40여년간 잠겨 버렸다.
그때가 1980년 5월 봄이었다. 공수부대가 고향 언저리에 도착했고, 뒤어 광주시내를 점령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누구네 집 사촌이 죽었다’, ‘어린 남자애가 총을 맞았다’, ‘산달 앞둔 임산부가 계엄군에 의해 죽었다’ 흉흉하고도 무서운 이야기가 빠르게 마을 주민 속으로 퍼졌다.
그러다가 누군가 말했다. “계엄군이 우리 마을도 온다여!” 주민들의 선택은 뜬금없게도 맞서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계엄군은 ‘군인’이 아니라 ‘학살자’였기 때문이다. 마을에 들어와 모두를 죽일수도 있다는 공포감과 아는 이들이 총탄에 쓰러진 분노가 겹쳐졌다. 주민들은 기민하게 움직였다. 일부는 광주의 현실을 알리기 위해 나주와 화순으로 움직였고, 나머지는 파출소 등지에서 무기를 획득했다. 살아야 한다. 지켜야 한다. 이것이 그들의 대명제였다.
이때 계엄군은 광주시민의 강력한 저항에 화순 능주와 광주 동구 주남마을로 퇴각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광주에는 아직 조선대학교 뒷산을 타고 태봉산으로 넘어와 진지를 구축한 7·11공수여단이 남아 있는 상태였다.
시민들은 돌아올 계엄군을 대비해 방어진을 만들었다. 가장 먼저 자리가 잡힌 곳이 바로 태봉마을 ‘배고픈 다리(홍림교)’였다. 당시 광주의 ‘시민지역방위군’은 지원동을 비롯해 △백운동 △화정동 △서방삼거리 △산수동 등지에 결성됐다.
그리고 운명의 80년 5월22일. 조선대 뒤 깃대봉에서 배고픈다리 쪽으로 내려오던 계엄군과 시민군간의 총격전이 벌어졌다. 시민군의 저항에 이번에도 계엄군은 물러났다. 시민군은 낙오된 계엄군을 생포, 전남도청으로 이송했다.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또 다른 태봉마을 주민들은 김밥과 주먹밥·박카스·담배 등을 마련해 함께했다. 승리의 기쁨과 불안 속에서 시민군들은 23일 시민수습대책위원회의 총기회수 결정에 따라 평화적으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악몽은 이후부터였다. 27일 도청이 진압되고, 계엄군의 세상이 됐다. 경찰을 앞세운 계엄군은 마을 주민 40여명을 대상을 ‘숨겨진 총을 내놓고 가담자를 말하라’며 가혹한 고문을 했다. 고통을 견디지 못한 마을 주민 몇몇이 그저 알고 지내던 사람의 이름을 토하듯 내뱉었다. 그러자 이름이 불린 이들은 개처럼 끌려가 죽을만큼 고문을 당했다. 그 지옥은 11월까지 이어졌다. 평화로웠던 마을은 순식간에 피폐해졌고, 서로를 믿지 못했으며 언제 끌려갈지 몰라 불안에 떨었다. 결국 하나 둘 집을 버린채 도망치듯 떠났고 쇠락해진 모습으로 지금까지 흘러왔다.
이들의 잘못은 무엇이었을까? 거대한 권력에 감히 대항한 것? 서울의 봄을 만들고 광주의 봄까지 만들려고 내려온 이들을 두팔 벌려 환영하지 않은 것?
44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날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곳은 여전히 우리에게 묻는다. “우리가 뭘 잘못한 거요?”
그때가 1980년 5월 봄이었다. 공수부대가 고향 언저리에 도착했고, 뒤어 광주시내를 점령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누구네 집 사촌이 죽었다’, ‘어린 남자애가 총을 맞았다’, ‘산달 앞둔 임산부가 계엄군에 의해 죽었다’ 흉흉하고도 무서운 이야기가 빠르게 마을 주민 속으로 퍼졌다.
그러다가 누군가 말했다. “계엄군이 우리 마을도 온다여!” 주민들의 선택은 뜬금없게도 맞서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계엄군은 ‘군인’이 아니라 ‘학살자’였기 때문이다. 마을에 들어와 모두를 죽일수도 있다는 공포감과 아는 이들이 총탄에 쓰러진 분노가 겹쳐졌다. 주민들은 기민하게 움직였다. 일부는 광주의 현실을 알리기 위해 나주와 화순으로 움직였고, 나머지는 파출소 등지에서 무기를 획득했다. 살아야 한다. 지켜야 한다. 이것이 그들의 대명제였다.
이때 계엄군은 광주시민의 강력한 저항에 화순 능주와 광주 동구 주남마을로 퇴각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광주에는 아직 조선대학교 뒷산을 타고 태봉산으로 넘어와 진지를 구축한 7·11공수여단이 남아 있는 상태였다.
시민들은 돌아올 계엄군을 대비해 방어진을 만들었다. 가장 먼저 자리가 잡힌 곳이 바로 태봉마을 ‘배고픈 다리(홍림교)’였다. 당시 광주의 ‘시민지역방위군’은 지원동을 비롯해 △백운동 △화정동 △서방삼거리 △산수동 등지에 결성됐다.
그리고 운명의 80년 5월22일. 조선대 뒤 깃대봉에서 배고픈다리 쪽으로 내려오던 계엄군과 시민군간의 총격전이 벌어졌다. 시민군의 저항에 이번에도 계엄군은 물러났다. 시민군은 낙오된 계엄군을 생포, 전남도청으로 이송했다.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또 다른 태봉마을 주민들은 김밥과 주먹밥·박카스·담배 등을 마련해 함께했다. 승리의 기쁨과 불안 속에서 시민군들은 23일 시민수습대책위원회의 총기회수 결정에 따라 평화적으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악몽은 이후부터였다. 27일 도청이 진압되고, 계엄군의 세상이 됐다. 경찰을 앞세운 계엄군은 마을 주민 40여명을 대상을 ‘숨겨진 총을 내놓고 가담자를 말하라’며 가혹한 고문을 했다. 고통을 견디지 못한 마을 주민 몇몇이 그저 알고 지내던 사람의 이름을 토하듯 내뱉었다. 그러자 이름이 불린 이들은 개처럼 끌려가 죽을만큼 고문을 당했다. 그 지옥은 11월까지 이어졌다. 평화로웠던 마을은 순식간에 피폐해졌고, 서로를 믿지 못했으며 언제 끌려갈지 몰라 불안에 떨었다. 결국 하나 둘 집을 버린채 도망치듯 떠났고 쇠락해진 모습으로 지금까지 흘러왔다.
이들의 잘못은 무엇이었을까? 거대한 권력에 감히 대항한 것? 서울의 봄을 만들고 광주의 봄까지 만들려고 내려온 이들을 두팔 벌려 환영하지 않은 것?
44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날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곳은 여전히 우리에게 묻는다. “우리가 뭘 잘못한 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