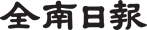취재수첩>아이들이 안전하게 귀가하는 사회
윤준명 취재2부 기자
입력 : 2025. 02. 24(월) 18:06

윤준명 취재2부 기자.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김하늘(7)양 피살 사건은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다. 김양은 방과 후 돌봄 교실에 있던 중 참변을 당했으며, 가해자는 학교에서 근무하던 돌봄 교사였다. 김양은 학교 시청각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고,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이 김양의 아버지에게 현장을 보지 않게끔 만류할 정도로 상황은 참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가해교사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휴직했다가 복직한 상태로 사건 발생 전부터 동료 교사를 폭행하고 의자를 던지는 등 이상 행동을 반복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던 점이다. 교육 당국은 해당 교사가 업무에 문제가 없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복직을 막을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 참극이 전해진 후 며칠간 마음이 무겁기만 했다. 학교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와야 할 아이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 일면식조차 없는 사람들마저 깊은 슬픔에 잠겼는데, 사랑하는 아이를 한순간에 잃은 유족의 고통은 감히 헤아릴 수도 없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광주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하굣길 참변과도 오버랩된다. 지난해 10월30일, 광주 북구 신용동에서 폐기물 수거를 위해 인도에 진입한 5톤 수거차량이 후진하던 중 하교하던 김모(7)양을 치었고, 김양은 큰 부상을 입고 결국 현장에서 숨졌다. 김양은 사고 직전 어머니와 “수업이 끝나 귀가 중”이라는 내용의 통화를 했지만, 끝내 집에 돌아갈 수 없었다. 걱정된 어머니가 밖으로 나가 보니, 김양의 신발과 가방이 수거차량 밑에 놓여 있었고, 현장을 확인하려던 어머니는 그 참혹함에 구급대원들에게 만류 당했다고 유족은 전했다.
두 사건은 서로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지만, 공통적으로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보인다. 유족과 인근 주민들은 “인근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어 학생들의 통행이 잦은데도, 차량들이 오랜 기간 인도 위에서 작업을 해왔다”며 “언젠가 한번은 사고가 날 것 같다는 불안감이 있었다. 결국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였다”고 입을 모았다. 해당 아파트 측은 사고 후에야 차량의 인도 위 진입을 막는 시설물을 설치했다.
모든 사고가 그렇겠지만, 돌이켜 보면 우리는 아이들의 불행을 막을 많은 기회를 놓쳤을지도 모른다. 해당 교사의 복직 신청에 대해 업무 수행 능력을 더 면밀히 검토했더라면, 인도를 진입하는 수거차량의 작업 방식이 안전한지 누구라도 점검했더라면, 이와 같은 참극은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두 유족은 큰 슬픔 속에서도 “제2의 피해자를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안전망이 사후약방문식으로 구축된다면, 또 다른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참극을 막을 수 없다. 하늘의 별이 된 두 아이에게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사과는 사회 전 분야에서 철저히 안전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뿐일 것이다. 집을 나선 아이들이 밝은 모습으로 귀가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본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가해교사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휴직했다가 복직한 상태로 사건 발생 전부터 동료 교사를 폭행하고 의자를 던지는 등 이상 행동을 반복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던 점이다. 교육 당국은 해당 교사가 업무에 문제가 없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복직을 막을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 참극이 전해진 후 며칠간 마음이 무겁기만 했다. 학교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와야 할 아이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 일면식조차 없는 사람들마저 깊은 슬픔에 잠겼는데, 사랑하는 아이를 한순간에 잃은 유족의 고통은 감히 헤아릴 수도 없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광주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하굣길 참변과도 오버랩된다. 지난해 10월30일, 광주 북구 신용동에서 폐기물 수거를 위해 인도에 진입한 5톤 수거차량이 후진하던 중 하교하던 김모(7)양을 치었고, 김양은 큰 부상을 입고 결국 현장에서 숨졌다. 김양은 사고 직전 어머니와 “수업이 끝나 귀가 중”이라는 내용의 통화를 했지만, 끝내 집에 돌아갈 수 없었다. 걱정된 어머니가 밖으로 나가 보니, 김양의 신발과 가방이 수거차량 밑에 놓여 있었고, 현장을 확인하려던 어머니는 그 참혹함에 구급대원들에게 만류 당했다고 유족은 전했다.
두 사건은 서로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지만, 공통적으로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보인다. 유족과 인근 주민들은 “인근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어 학생들의 통행이 잦은데도, 차량들이 오랜 기간 인도 위에서 작업을 해왔다”며 “언젠가 한번은 사고가 날 것 같다는 불안감이 있었다. 결국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였다”고 입을 모았다. 해당 아파트 측은 사고 후에야 차량의 인도 위 진입을 막는 시설물을 설치했다.
모든 사고가 그렇겠지만, 돌이켜 보면 우리는 아이들의 불행을 막을 많은 기회를 놓쳤을지도 모른다. 해당 교사의 복직 신청에 대해 업무 수행 능력을 더 면밀히 검토했더라면, 인도를 진입하는 수거차량의 작업 방식이 안전한지 누구라도 점검했더라면, 이와 같은 참극은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두 유족은 큰 슬픔 속에서도 “제2의 피해자를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안전망이 사후약방문식으로 구축된다면, 또 다른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참극을 막을 수 없다. 하늘의 별이 된 두 아이에게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사과는 사회 전 분야에서 철저히 안전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뿐일 것이다. 집을 나선 아이들이 밝은 모습으로 귀가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