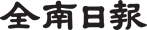이윤선의 남도인문학>광주비엔날레, 판소리로 그려낸 ‘모두의 울림’
419. '판소리-모두의 울림'과 공명(共鳴)
입력 : 2024. 10. 31(목) 16:46

제15회 광주비엔날레 판소리-모두의 울림 도록 표지 그림
 |
| 제15회 광주비엔날레 판소리-모두의 울림 도록 내지 그림 |
2024년 광주비엔날레 주제 <판소리-모두의 울림>의 시선으로부터
니콜라 부리오는 판소리를 슬픈·평화로운·장난스러운·극적인 장면들이 교차하는 우회적인 예술이라 했다. 이것은 인류에게 오랫동안 제안되었던 4개의 미학 범주에 환류될 수 있다. 슬픈 것은 숭고미에, 평화로운 것은 우아미에, 장난스러운 것은 골계미에, 극적인 것은 비장미에 비유된다. 총 30개국 72명의 작가들이 모여 벌인 세 개의 ‘판’ 곧 ‘마당’에 이를 늘어놓았다. 인구 포화와 밀집 주거 등 오늘날 공간과 환경의 관계를 성찰하는 <<부딪침 소리>>가 첫 번째 마당, 동식물과 원소, 기계 등 지구 구성체들과의 소통을 도모하는 <<겹침 소리>>가 두 번째 마당, 미시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인간이 아닌 존재들의 삶을 탐구하는 <<처음 소리>>가 세 번째 마당이다. 각각 포화공간, 관계적 공간, 옴이라는 다른 제목들을 붙였다. 마당을 소리의 공명통 삼았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종합하는 관점으로 질 들뢰즈와 펠릭스 가타리가 제안하였던 ‘리토르넬로’ 개념을 차용하였다. 나 또한 오래전부터 이를 인용해왔던지라 반가웠다. 한 대목을 다시 가져와 본다. “수컷 굴뚝새는 영토를 얻게 되면 흔히 있기 마련인 침입자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음악상자 리토르넬로’를 만들어 낸다. 그러고 나서 영토 안에 직접 집을 짓는다. 심지어 12개씩이나 지을 때도 있다. 암컷이 다가오면 한 집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집 속을 들여다보는 암컷에게 들어오라고 재촉한다. 꼬리를 낮추고 노랫소리를 점차 약하게 한다.(중략) ‘구애’의 기능 역시 영토화되어 있다.” 여기서 내가 주목했던 것은 시간 예술과 공간예술 즉 음악과 미술에 대한 들뢰즈의 시선이다. 수컷 굴뚝새가 경고의 의미로 만들어 내는 지저귐의 공간이 소리의 영토다. 그는 이렇게 비유한다. 화가는 체세포(soma)에서 생식질(germen)로 향하는 반면 음악가는 생식질에서 체세포로 향한다. 소마(Soma)는 정신에 대칭되는 몸 혹은 신체라는 뜻이고 저민(Germen)은 유전과 생식에 관여한다고 생각되는 생식세포다. 음악가의 리토르넬로는 화가의 리토르넬로와 역상(逆像)이다. 반대라는 뜻이 아니라 대칭(對稱)이다. 나는 이를 주역의 대대성(對待性)으로 풀이해왔다. 비엔날레 작가들의 작품과 이번 주제인 ‘판소리’에 견주어 말한다면, 전시 작품들은 몸 혹은 신체로부터 소리의 이면(裏面) 곧 정신으로 향한다. 반대로 판소리 창자들은 흉중의 드러나지 않은 어떤 심원(心源) 즉 정신으로부터 몸 혹은 신체로 향한다. 니콜라 부리오는 이 지점을 상상했던 것 같다.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농악이나 무악(巫樂)이 ‘모두의 울림’에 오히려 어울리기 때문이다. 판소리 연행을 ‘울린다’고 하지는 않지만 농악이나 무속음악 연행은 아예 ‘울린다’고 표현한다는 점을 상고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마당 <<처음 소리>> 전시들을 보면 이 점이 도드라진다. 땅과 하늘을 울리고 조상과 후손을 울리며 나무와 숲과 바람과 비와 상하좌우 모든 관계를 울리는 것이 울림의 요체다. 공명(共鳴)을 리토르넬로에 대입해 말하면, 새(鳥)가 더불어(共) 우는(口) 공간 혹은 장소에서 행한 기술(예술)이다. 따라서 이번 비엔날레의 주제 <판소리-모두의 울림>은 공명의 공감을 목적으로 한 전시라고 이해할 수 있다. 판소리가 이면(裏面)의 예술이란 말을 듣고, 내밀한 어떤 속에서 끄집어내는 소리 예술의 측면을 주목했다는 뜻이다.
남도인문학팁
다시 판소리의 첫 자리를 상고하며
2024년 제15회 광주비엔날레 작품들을 감상하고 몇 마디 보탰다. 민속예술 전공자로서 직무유기는 벗어나야겠다는 속셈이라고나 할까. 판소리의 내력에 대해 좀 더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그 중심에 있다. 판소리에 대한 이해가 성글지만, 시각예술의 주제로 내세운 용기가 가상하다. 예컨대 온몸으로 세계를 맞이하는 ‘고수’와 그의 소리북이 전 우주의 리듬을 바꾸어 놓는다는 선언을 보라. 얼마나 의기양양한가. 하지만 판소리를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었다면 더 풍부한 기획과 전시를 끌어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판소리를 시작했던 첫 자리를 무속음악으로 오해한 듯하다. 판소리의 성장과 발전에 스며든 기술들에 대한 천착도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지난 1세기 동안 판소리를 비롯한 남도음악이 한국음악 즉 국악을 어떻게 장악했는가에 대한 내력을 주목하지 않았다. 기후위기 시대의 진단 혹은 처방을 말하려면 적어도 여기까지는 얘기해야 한다. 주제로 판소리를 표방했기에 하는 말이다. 그래서다. 작정하고 단행본 한두 권 분량으로 판소리를 정리해둬야겠다는 생각을 줄곧 하고 있다. 예컨대 정노식은 판소리의 바이블이라는 ‘조선 창극사’(1940년)를 집필하며 왜 ‘판소리’라고 하지 않고 ‘창극’이라고 했을까? 이 당시까지만 해도 음악으로서의 판소리보다는 연극적인 측면, 이야기적인 측면, 연희적인 측면이 더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잘라 말하면, 이야기극은 판소리에 후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한다. 기왕의 연구들을 뒤집는 주장이다. 나는 거듭하여 주장해왔다. “판소리는 이야기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고안된 음악 양식이다.” 여기에 음악 기술이 어떻게 작동되었는지, 남도라는 지역 혹은 공간이 어떻게 작용하였는지, 특히 기후위기 시대의 길목에서 판소리의 어떤 무엇을 길어 올릴 수 있는지 등 주목해야 할 내력들이 수두룩하다. 그럼에도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시각예술의 마당에 판소리를 주제로 세운 데 대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세세한 이야기는 따로 기회를 만들어 소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