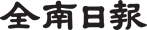"매년 초파일이 기일"…윤재식 열사 부인 배용희씨 참배
"식량 구해오겠다" 나간 뒤
도청 앞 집단발포 당시 피격
도청 앞 집단발포 당시 피격
입력 : 2024. 05. 15(수) 18:04

5.18민주화운동 44주기를 사흘 앞둔 15일 고(故) 윤재식 열사의 부인 배용희(73)씨가 남편의 기일을 맞이해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았다. 윤준명 수습기자
“‘나를 만나지 않았으면 살아 있었을까. 내가 죄지은 것 같다’ 생각했어요.”
5·18민주화운동 44주기를 사흘 앞둔 15일. 고(故) 윤재식 열사의 부인 배용희(73)씨와 그의 가족들이 기일을 맞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았다.
1980년 5월 당시 식료품 업체를 운영하던 윤 열사는 21일 도청 앞에서 시위하던 중 계엄군의 집단발포에 목숨을 잃었다.
윤 열사는 21일 오전 “사태가 길어질 것 같으니 비축할 식량을 구해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서 돌아오지 않았다.
배씨는 친척과 지인들에게 남편의 행방을 수소문 했고 “도청 앞에서 시위하는 걸 마지막으로 봤다. 위험하니 빨리 집으로 들어가라고 했다”는 답변을 받았다.
더 기다릴 수 없었던 배씨는 광주 내에 위치한 모든 종합 병원에 전화했다. 당시 적십자병원에서 “환자가 많으니 와서 확인하라”라는 말을 전해들은 배씨는 남편이 부상으로 입원해 있을 것이라 믿으며 친정아버지와 함께 적십자병원으로 향했다.
배씨는 “시민군 지프차를 타고 적십자병원 앞에서 내렸다. 병원 앞 광장에 사망자 명단(인상착의)이 있었다"며 "남편의 인상착의와 비슷한 사람이 있어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고 회상했다.
배씨는 이어 “친정아버지 혼자 병원 영안실에 들어갔다 돌아와 ‘네 인생 이제 망했다’며 화를 냈다. 발이 안 떨어져 끌려들어가 확인하니 남편이 맞았다”고 말했다.
그는 “배에 총을 맞았는데, 머리가 크게 함몰돼 있었다. 총을 맞고도 계엄군에 폭행당한 듯했다. 시신을 들어 올리니 피가 왈칵 쏟아졌다”고 말했다.
배씨는 남편의 시신을 도청으로 옮겼다 다시 상무관으로 옮겼다. 그는 “우리는 그래도 남편 시신을 빨리 찾아 신경 써서 돌볼 수 있었다. 옷에 피가 많이 묻어, 매일 남편이 좋아했던 옷으로 갈아입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7일 군의관이 시체 검안을 한다고 찾아왔다. 이후 시신을 안장한다고 하더니 상무관 일대를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다. 바리게이트가 쳐져 있었는데, 당시 사고로 목발을 짚고 있던 시숙과 함께 억지로 안으로 들어갔다”며 “그때 상무관에서 시신을 실어 나르는 모습을 봤다. 지금 행불자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배씨는 도저히 광주에 있을 수 없어 1981년 서울로 떠났다가 1984년 다시 광주로 돌아왔다.
그는 “미행과 감시가 있었지만 아이들을 보며 꿋꿋하게 살았다”며 “젊은 사람들도 5·18에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한다. 아직 밝히지 못한 진실이 너무 많다”고 덧붙였다. 나다운·윤준명 수습기자
나다운·윤준명 수습기자
5·18민주화운동 44주기를 사흘 앞둔 15일. 고(故) 윤재식 열사의 부인 배용희(73)씨와 그의 가족들이 기일을 맞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았다.
1980년 5월 당시 식료품 업체를 운영하던 윤 열사는 21일 도청 앞에서 시위하던 중 계엄군의 집단발포에 목숨을 잃었다.
윤 열사는 21일 오전 “사태가 길어질 것 같으니 비축할 식량을 구해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서 돌아오지 않았다.
배씨는 친척과 지인들에게 남편의 행방을 수소문 했고 “도청 앞에서 시위하는 걸 마지막으로 봤다. 위험하니 빨리 집으로 들어가라고 했다”는 답변을 받았다.
더 기다릴 수 없었던 배씨는 광주 내에 위치한 모든 종합 병원에 전화했다. 당시 적십자병원에서 “환자가 많으니 와서 확인하라”라는 말을 전해들은 배씨는 남편이 부상으로 입원해 있을 것이라 믿으며 친정아버지와 함께 적십자병원으로 향했다.
배씨는 “시민군 지프차를 타고 적십자병원 앞에서 내렸다. 병원 앞 광장에 사망자 명단(인상착의)이 있었다"며 "남편의 인상착의와 비슷한 사람이 있어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고 회상했다.
배씨는 이어 “친정아버지 혼자 병원 영안실에 들어갔다 돌아와 ‘네 인생 이제 망했다’며 화를 냈다. 발이 안 떨어져 끌려들어가 확인하니 남편이 맞았다”고 말했다.
그는 “배에 총을 맞았는데, 머리가 크게 함몰돼 있었다. 총을 맞고도 계엄군에 폭행당한 듯했다. 시신을 들어 올리니 피가 왈칵 쏟아졌다”고 말했다.
배씨는 남편의 시신을 도청으로 옮겼다 다시 상무관으로 옮겼다. 그는 “우리는 그래도 남편 시신을 빨리 찾아 신경 써서 돌볼 수 있었다. 옷에 피가 많이 묻어, 매일 남편이 좋아했던 옷으로 갈아입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7일 군의관이 시체 검안을 한다고 찾아왔다. 이후 시신을 안장한다고 하더니 상무관 일대를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다. 바리게이트가 쳐져 있었는데, 당시 사고로 목발을 짚고 있던 시숙과 함께 억지로 안으로 들어갔다”며 “그때 상무관에서 시신을 실어 나르는 모습을 봤다. 지금 행불자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배씨는 도저히 광주에 있을 수 없어 1981년 서울로 떠났다가 1984년 다시 광주로 돌아왔다.
그는 “미행과 감시가 있었지만 아이들을 보며 꿋꿋하게 살았다”며 “젊은 사람들도 5·18에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한다. 아직 밝히지 못한 진실이 너무 많다”고 덧붙였다.